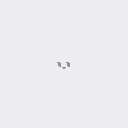 작성자:
WeissBlut
쪽지보내기
홈페이지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8.220.*.*)
작성자:
WeissBlut
쪽지보내기
홈페이지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8.220.*.*)
일반 프로듀서
글
댓글: 7 / 조회: 3820 / 추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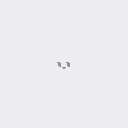 작성자:
WeissBlut
쪽지보내기
홈페이지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8.220.*.*)
작성자:
WeissBlut
쪽지보내기
홈페이지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8.220.*.*)
일반 프로듀서
“타카네, 달에는 뭐가
있는거냐?”
부두에 서 언제나처럼 달을 올려다보는 타카네를, 조수의 냄새가 감쌌다.
두상에는 만월과, 달라붙을 것 같은 샛별. 톰 웨이츠의 술에 잠긴 것 같은 목소리*酒焼けた声가 들릴 것 같은 밤이다.
라던가.
“아무것도 없으면, 올려봐선 안되는겁니까?”
목소리마저 무표정을 가장하면서, 타카네는 천천히 나를
보았다. 알고 있다고. 바람에 날린 바닷물이 눈에 들어간 거지? 토끼처럼 새빨간 건 그 녀석의 탓이다.
“이제부터
어쩔거야?”
타카네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다시 달을 올려보았다. 이번엔…. 그래, 파랑새라도 날았던거지? 울지도 않았는데
눈물이 떨어질 리가 없으니까.
멀리서 겹쳐진 기적소리가, 하늘과 바다에 빨려 들어갔다. 불붙였을 뿐인 담배는 갯바람에 젖어 습기차기
시작했다. 험프리 보가드쯤 되면 모양새가 날 정경이지만, 공교롭게도 그런 처지가 아니다.
“모두들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제각각이겠지. 딱 잘라 단념하는 녀석. 다른 사무소에서 발버둥치는 녀석. 미안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닭 쫓던 개 지붕만 쳐다본다*骨折り損のくたびれ儲け’는 녀석이 될 것 같고 말야.
“넌 달에 돌아가는거냐?”
“그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럼, 나도 데려가라.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뒹굴뒹굴하고싶으니까.”
반은 진심이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스스로도 모르겠지만서도.
“제가 모시고 돌아가는 남성분*殿方께서 소심자*甲斐性なし여서야, 모두에게 모범이 서지
않는지라.”
이런 때까지 공주님이신가. 지금은 웃어넘길 부분이잖아? 농담이 통하지 않는 성격은 만났을 무렵과 변하지
않았구만.
“달은 스스로는 빛나지 않는 존재…. 이 밤하늘의 저쪽에서는, 지금도 태양으로부터의 빛을 반사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라도 알고있어, 그정도는. 그래도, 네가 말하면 신비하게 들리니까 이상하군. 지금 이건 칭찬이야? 미리
말해두지만.
“당신은 어찌하시려는지요?”
“남아있어도 어쩔 수 없잖아. 뒤처리도 귀찮을 것 같고.”
“역시나
소심자.”
그거, 어휘의 사용법을 틀린 거 아냐?
“태양이라도 언젠가 죽어버리는거야. 사무소도
무너지고.”
“예. 실로 허망하게도.”
정말로 눈 깜짝할 사이였다. 손이 많이 가는 녀석들 뿐이었지만, 그 녀석들은
싫지 않았다고.
“오늘밤은 어째서, 저에게?”
“글쎄, 왜일까?”
너에게 반했기 때문에, 라고 말하면
믿을까? 아니, 반은 진심이야. 나는 큰 슴가에 약하거든. 돌아가신 어머니도 컸기 때문일거야, 분명.
“…담배, 과하신 것
아니신지?”
“여기는 금연석이었던가?”
“17세의 규수의 앞이에요?”
“그럼, 최고속으로 스무살이
되어줘.”
스무살이 된 타카네는 어떠려나? 좋은 여자인 건 틀림없겠지. 우선, 나랑은 관계도 없어지겠지만.
“저는 여기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방해해서 미안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씀드리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웃음밖에 안나오는데. 농담이건 진심이건.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정. 역시 웃을 수 없구만. 아무래도 진심으로 보이니까.
“왜? 안아주기라도 바라는건가?”
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그런
얼굴로 바라보면.
“저는 달입니다. 비춰주는 빛이 필요합니다.”
그건 과소평가지. 주위에 몇백명이 있더라도,
네가 있는지는 바로 알 수 있다. 흑심 빼고 말야.
“당신도 달입니다. 저희들은, 닮아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블랙홀이다. 어떤 강한 빛이라도 들이마셔서, 새카맣게 만들고 만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
처럼.
“그러니까 타카네, 만약 나랑 함께하려고 한다면 그만해둬.”
“정말로 소심한 사람.”
“아아, 내가
죽으면 묘비에 그렇게 새겨줘.”
이상하다니까. 모두들 나를 과대평가한다고. 아버지도 교사도 타카기 사장도, 그리고 담당했던
아이돌들도. 아니, 리츠코에게는 내 밑바닥이 드러났던가?
“당신도 저를 혼자로 만드시는겁니까?”
“아무래도
소심자니까.”
타인의 인생을 짊어지는 건 이제 안녕이다. 아침부터 슬롯머신이라도 하고 있는 게 나에게는
어울리지.
“그저 당신의 곁에 있고 싶을 뿐이라고 해도?”
“미안하군 타카네. 그런 여자냄새 나는건
싫어해.”
큰슴가랑 그거랑은 다른 이야기다. 남심은 복잡해서.
“내일 같은 시간, 이 장소에서 다시 귀하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자유지. 오는 것도 말야.”
“만약 오지 않으신다면…”
“다면?”
“…정말로 달로 돌아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당히 멋부린 협박문이군, 공주님.
아파트에 돌아가
뜨거운 샤워를 했다. 낡은 스테레오로 쳇 베이커를 들으면서 스캐파를 락으로 들이킨다. 아무리 두둔해봐도 좁은 다다미방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I fallin` love so easily, I fallin` love too fast
가슴이 아플 정도로 달콤한
러브송이 방 안을 채운다.
이런 때에 타카네를 떠올리는 것은 자연스러운거지? 그 녀석, 좋은 여자잖아. 겉보기도 내용물도. 만약
“안아줘” 라는 말을 들었더라도 쫄아버리겠지, 한심하게도. 뭐, 보증붙은 소심자고. 거기다 뭐라해도 침범하기 어려운 위엄 같은 것이 있거든,
타카네에게는. 남자에게 올라타서 히익히익하고 헐떡이는 그 녀석은 상상도 안 된다.
휴대전화의 디스플레이에는 내일의 일기예보가
흐르고 있었다. 도쿄는 하루종일 비, 라고. 그래도 기다리는 걸까, 그 공주님. 아마, 우산도 없이. 슬쩍 우산을 씌우는 나. 그리고 꽉 껴안는
둘. 영화라면 야유가 나올 썰렁한 연출이군.
다음날, 두통으로 깨어났다. 머리맡에는 스캐파의 빈병. 그 근처의
시계는 오후 3시 32분을 가리키고 있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숫자다. 커튼을 걷자 평온한 겨울 하늘이 펼쳐져있다. …일기 예보가 빗나가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
어제 타카네랑 만난 것은…. 분명 20시 넘어서다. 그러고보면, 아직 아무것도 정하지
않았다. 만나러 갈지 어떨지. 만약 타카네를 만난다고 해도, 어떻게 하고 싶은지.
가지 않으면 끝나는 얘기라던가, 그런 당연한 얘기를
하는 녀석이랑은 친구는 못된다고?
휴대폰에서 U2의 Beautiful Day가 흐른다. 아무래도 메일이 온 것 같다. 발송인은
치하야. 아무래도, 졸업한 뒤에는 해외에 유학하기로 결정한 것 같다. 아아, 너의 재능이라면 괜찮아. 어서 내 손이 닿지 않는 존재가 되어 줘.
그래도, 슴가가 커지면 또 만나자고?
거리를 어슬렁어슬렁거리면서 무의미한 시간을 보낸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물색에서
보라색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어딘가에서 카레 냄새라도 날 것 같은 분위기다. 이런 때 정도는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지 않으면 말이지. 지금쯤
타카네도, 똑 같은 센티멘탈리즘*センチメンリズム에 잠겨 있을까?
19시 넘어, 전철은 해안을 달리고 있었다.
차창너머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구름밖에 없었다. 일기예보는 1/3정도 정답이군. 잘 일하고 있어, 기상청.
전철에서 내리면,
홈은 침수가 되어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역의 매점의 우산은 매진이다. 우산도 없냐, 는 나인가. 하는 수 없지. 제임스 딘이라도
되어주지.
20시 15분에 어제와 같은 장소에 도착했다. 타카네의 성격이라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을 테지만….
“…그러기로 한거냐.”
과연. 오지 않는 것도 자유, 라고 누가 말했던것같군.
담배에 불을 붙여 보았지만, 바로
비에 젖어 꺼져버린다. 어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꼭 껴안았다면, 같은 걸 생각해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떠나가는
일체는 비유에 지나지 않는다고.*去りゆく一切は比喩に過ぎない、ってね 몇 개째의 담배를 무용지물로 하고, 나는 비구름의 저편으로 만월-1의 달에
이별을 고하려고 했다.
그렇지만…. 좀처럼 마음대로는 되지 않는 거로구만, 만나는 것도 헤어지는
것도.
“일기예보를 모르셨던 겁니까?”
“아니, 나는 기상청에 미움받고 있어서. 다음에 과자상자라도
보내드려야지.”
주홍색의 종이우산으로 등장이라니, 차분하구만 너.
“늦어져서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어젯밤
만났던 건 20시 43분이었기에.”
“이거야 세심하기 그지없군요.”
“감기라도 드셨는지요?”
“하는김에 감기한테서도
미움받고싶구만.”
주황색 종이우산이 공중에 춤추고, 팔랑팔랑 부두에 떨어졌다. 아아, 야유가 나올 썰렁한
연출이다.
“어딘가에서 몸을 쉬게 하죠….”
“안을 수 없어, 너는.”
“가까이 있는 것 만으로는
안되는겁니까?”
코트를 입고 있는데도 타카네의 체온이 전해져온다. 아마 타카네도 똑같겠지. 젖은 은빛의 머리칼이 가로등 불을
받아 빛나고 있다. 그 속에 얼굴을 묻자 왠지 그리운 향기가 났다.
“저는….”
타카네가 뭐라 말을 다 끝내기
전에, 나는 입술을 겹쳤다.
무서웠던 것이다. 타카네의 말을 듣는 것이. 그러니까 긴 시간, 입술을 서로 겹쳤다. 요컨데 백기 대신이란
거다.
“타카네, 나한테 올거냐?”
“그 밖에… 갈 곳은 없사옵건데.”
아,
항복이다.
롤링 스톤즈도 파산했던 적이 있다. 우리들도 정리하자고. 타카네, 스톤즈 알고있어? 아니, 아무래도 좋아. 그런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어젯밤 달처럼 빛나는 은빛의 머리칼을 어루만지며, 나는 다시 키스를 했다. 비록 달에 아무것도 없어도, 지금부터는 함께
올려봐주지. 그런거잖아? 공주님.
끝
분위기는 그럴듯한데 사실 별 내용은 없는 단편이군요 (…) 손발이 오그라들것같아! 그냥 오히메찡이 히로인이고 분량도 짧은거라서 번역했습니다.
총 13,873건의 게시물이 등록 됨.
7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부러우면 지는거다
부러우면 지는거다
부러우면 지는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