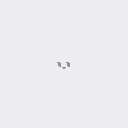 작성자:
세휘
쪽지보내기
홈페이지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76.*.*)
작성자:
세휘
쪽지보내기
홈페이지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76.*.*)
일반 프로듀서
엽편
댓글: 1 / 조회: 1366 / 추천: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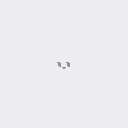 작성자:
세휘
쪽지보내기
홈페이지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76.*.*)
작성자:
세휘
쪽지보내기
홈페이지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76.*.*)
일반 프로듀서
관련 링크가 없습니다.
올해 2월 아이마스 온리전에서 판매됬던 곰치님의 하루마코 소설을 읽고 쓴 3차창작글...입니다! 애니마스에 잠깐 나왔던 무진합체 키사라기의 하루슈타인+따까리 마코토(전직용사 현직빌런)설정을 빌렸습니다. 무지 오래된 글이라 염치도 없고 기승전표류하네요..down....down...
본편인 곰치님의 소설을 못 보신 분이라면 스토리가 이해가 될것같지가 않아서 아 그냥 이런 삽질을 하는놈도 있구나..하고 둥글게 둥글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오^!!
While the light lasts I shall remember,
and in the darkness I shall not forget
지금, 나는, 여기에, 있다.
그것은 이상하다.
콧날이 시큰한 화약 냄새가 아직도 곳곳에 진동했다. 부서진 건물의 잔해가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이 끝없이 뻗어있는 광활한 풍경에 삭막함을 더했다. 부스러기, 먼지들. 탁한 공기.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상하다.
그 앞에서 나는 유리를 깨트린 아이처럼 황망할 뿐이었다.
-멍청하긴.
거칠게 내뱉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 아래 부복한 나는 고개를 더욱 조아리며, 그녀의 발끝만을 내려다 보는 것 외엔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실은 저 가파른 분노는 나를 향한 것이 아닌, 스스로 끊임없이 충돌하는 부싯돌에서 가끔 튀어오르는 불꽃 같은 것임을 나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처음부터 악으로 정해져 태어나는 게 어떤 일인지, 네가 어떻게 알아!
유리잔이 머리로 날아와 부딪쳐 산산조각이 났다. 빛을 받아 반짝이는 유리 조각들과 점점이 흩어진 핏방울을 눈으로 헤아리며, 고통은 느껴지지도 않고 다만 그날 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내 방으로 찾아올 그녀의 상냥한 손길이 기다려질 뿐이었다.
그 손길을 더이상 느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은 믿기 힘들다.
-악역이란 게 그런 거잖아?
삶, 죽음.
그녀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다.
숨이 희미해져 가는 동안에도 엉망으로 상처가 패인 얼굴은 담담했다. 그 어떠한 일에도 초연해져야 한다고 늘 말했었다. 설령 죽음 앞에 덜컥 모가지가 놓이더라도. 태초에 누가 이 여리기만 한 소녀에게 이런 영겁의 죄를 지웠을까? 상처나 핏자국 따위는 조금도 어울리지 않는 얼굴을, 한 꺼풀만 벗겨 내면 금방이라도 그 또래 보통 여자아이다운 웃음이 흐드러질 것 같은 그 얼굴을. 나는 흩어지는 연기를 붙잡는 심정으로 계속해서 어루만졌다.
이제는 무엇을 더 해야할 지 알 수 없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만은 여전했다. 늘 그녀를 위해 존재했던 나는 더이상 쓸모가 없어진 채로 울었다. 끊임없이 굴러 떨어지는 눈물은 그녀의 볼에서 멍울져 다시 흘렀다. 그러면 달래듯, 미소지은 입술에서 한 자 한자 힘겹게 말이 떨려 나왔다.
-하루카라고……불러 줘.
“…하루카.”
바싹 마른 입술을 거쳐 나온 말이 순식간에 부스러져 건조한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어라?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하루카, 하루카, 하루카… 혀가 굳은 것처럼 입속에서 딱딱 부딪쳤다. 한참동안 혼자 중얼거리다 결국 입을 다물었다. 온 몸으로 소름이 끼쳤다.
하루카.
나는 이제 어쩌면 좋지?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모든 것이 내 손끝에서 허물어지던 감촉이 역으로 엄습했다. 건물, 사람들, 닥치는 대로 부쉈다. 조종간 위에서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그 오래전의 일 후 학습된 평화에 무뎌질대로 무뎌진 그것들은 너무나도 쉽게 무너졌다. 저들끼리 뭉쳐 그토록 완고하게 그녀의 존재를 막아섰던 철옹성이… 그 생각을 할 때 나는 먹어치울수록 허기지는 괴물이었다.
그녀들을 다시 보았다. 여전히 그 올곧음으로 가득 찬 눈빛을 하고. 잘나신 영웅의 광채를 두르고 있었다. 내가 저렇게 될 수도 있었겠지. 시간을 되돌린다면… 패배하기 전으로. 아니 아예 그녀를 만나기 전으로. 이 죄의 시발점을 밟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허기를 달랠 방법은 제 살을 뜯어먹는 것 밖엔 남아있지 않은 것이다.
보아선 안될 것을 본 듯이, 손대지 말아야 할 것에 마음을 품은듯이.
나는 금기를 넘어섰다.
아직도 화약 냄새는 가득하다. 한계까지 몰아내 만신창이가 된 로봇에 다시 기어올랐다.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아껴둔 힘을 짜내 조종간 한 가운데로 말아쥔 주먹을 내리쳤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기체는 잠에서 깨어나는 것 처럼 우우웅, 하고 떨며 반응해 왔다. 자폭시스템이 가동되었습니다. 탑승자는 신속히… 사이렌을 한 귀로 흘려 들으며 나는 등을 기댔다.
그녀에게 어떤 말을 가장 먼저 건네야 할 지 미리 생각해 둬야 했다. 그녀는 아침의 첫 인사에 대해서는 퍽 까다로우니까. 어쩌면 허락없이 멋대로 행동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녀 마음에 들 변명 따위 얼마든지 고해바칠 수 있다. 하지만 이번만은 그저, 꾸밈없이 진실을 말하기만 하면 될 것이다. 단지 당신의 평소 분부대로, 더 이상 쓸모도 의미도 잃어버린 것을 처리했을 뿐이라고.
당신이 없는 이 세계.
빛이 없는 세계를.
총 1,260건의 게시물이 등록 됨.
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잘 읽고 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