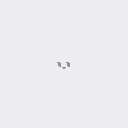 작성자:
sokeno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8.14.*.*)
작성자:
sokeno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8.14.*.*)
일반 프로듀서
글
댓글: 2 / 조회: 582 / 추천: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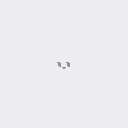 작성자:
sokeno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8.14.*.*)
작성자:
sokeno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8.14.*.*)
일반 프로듀서
관련 링크가 없습니다.
“윤!”
몇 년이나 지났다고, 이젠 네가 짓던 표정 하나하나 제대로 기억할 수조차 없다.
“뭐, 꼬맹이.”
추억은 잔인하게 파도 치고, 아래로 가라앉았다 믿었던 기억은 하나 둘 수면 위로 떠오른다. 스스로를 옭매기 위해 가둬 뒀던 나의 과거. 가장 하지 말았어야 한 선택을 함으로 만든 후회와 죄책감. 더 이상 상처 받지 않았어야 할 너의 믿음을 부숴버린 최악의 상처.
“고마워, 여기까지, 날 버리지 않아줘서!”
추억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돌고 돌다 지쳐가고, 더 이상 느껴야 할 감각조차 느낄 수 없다. 숨을 턱까지 막혀오며, 내뱉는 숨은 점차 짧아져 간다. 그리고, 추억의 바다에 비친 하늘로 추락한다.
“나한테 감사할 필요 없어. 네가 만족스럽지 않았다면 버리고 갔을 거였으니까.”
“에이, 또 그런다!”
그래, 전부 잊어버리려 해도, 남아있는 추억 속에 빠져 눈을 감으면 그 표정만큼은 기억할 수 있어. 넌 그 때 그런 표정으로 바라봐 줬지. 처음 봤을 때와는 정 반대의 표정. 너를 처음 봤을 때와 같이, 아마 내 심장에 영원히 흉터로 나마 남아 있을, 도려낼 수도 없는 그 표정.
“그래도 잘 따라왔네, 우리 느림보.”
한 때나마 내 삶의 의미 중 하나였던 너는, 이제 내게 있어서는 한 때의 소나기였을 뿐. 끝내 내 기억의 한쪽을 적셔버린, 가장 아름답게 채색되었던 빗물의 수채화로 남았지만, 결국엔 한 폭의 그림으로 밖에 남지 못한 추억.
“헤헤, 그런 느림보라도 괜찮다며 끌고 온 게 누군 데!”
그런 너에게, 난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 아마 기억하고 싶어 지지도 않는, 최악의 흉터로 남았을 지 몰라. 나처럼 필사적으로 그 때를 잊어버리려 하고 있는지도 모르지. 시간의 흐름 속에, 가장 아팠을 기억이 천천히 흐려지고, 이젠 기억 한 편에 잠들어 있는 악몽으로 묻어 뒀을 거라 믿고 싶어.
“윤..! 윤..! 제발.. 제발 뭐라고 말이라도 해봐!”
그날 이후로 톱니바퀴들이 삐걱 이고, 느림보였던 너보다 나는 뒤쳐졌지. 12시가 되어 풀려버린 마법의 시계 바늘은 예전과는 다르게 우리 사이를 가르는 잔혹한 경계선이 되었지. 넌 아마 믿고 싶었겠지. 너와 내 사이에 있던 거리가, 이번엔 단지 반대가 되었을 뿐이라고.
“제발, 부탁이니까..”
미안해, 난 망가져 버렸 어. 미안해, 두 번째 마법을 걸어주는 건, 내가 되지 못해서. 미안해, 엉터리 마술사여서. 미안해, 이런 나라도 욕심을 부리고 싶어서.
신데렐라, 내가 너에게 건 마법이 영원히 풀리지 않기를 바래.
부서진 시계 바늘은, 12시를 가리킬 수 없으니까.
12시가 되지 않는다면, 마법은 풀리지 않으니까.
넌 내가 후회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과거.
나의 신데렐라, 그대가 나의 마법 없이도 행복하길.
-------------------------------------------------------------------------------
난, 눈 앞의 소녀에게 무엇을 기대하는 것일까?
그녀와 닮은 것은 한 순간의 분위기 뿐이었다. 양쪽으로 묶은 주황 빛의 머리도, 내 어깨에 조금 못 미치는 키도, 편견일지 모르지만 조금은 불량해 보이는 분위기도. 어느 것 하나도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 확신하지 못하게 했다.
“.. 아이돌?”
내가 건내 준 명함을 받은 그녀의 눈에 조금 흥미가 깃든 듯했다.
“헤에, 이 프로덕션이라면 들어 봤 어. 아마 타카가키 카에데가 소속된 프로덕션이었지?”
“네, 우리 프로덕션의 첫 아이돌이죠.”
일단 대답은 했다만, 빌어먹을, 뭐라고 해야하지? 착각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의 반쯤 충동적으로 한 제안이다. 이미 바락바락 악을 써서 강제로 연습생 몇 명을 추가 시킨 상황인데, 우리 프로덕션 규모를 생각했을 때, 이 이상 추가는 힘들 수도 있다. 내 착각일 뿐이라면, 내가 이 소녀에게 집착할 여유는 딱히 없는 상황이란 거다. 하지만, 착각이 아니라면?
“아이돌, 아이돌이라.. 옛날에, 병원 TV에서 자주 봤지.”
소녀가 시선을 돌리고, 자신의 머리끝을 만지작거린다. 이런 제안을 받으면 고민을 하는 게 보통일 텐데, 그녀의 모습은 고민을 한다고 보이지는 않았다. 왠지 모르게 초연한 태도. 고민이 아닌, 마치 이미 오래전에 대답은 정해져 있었고, 그 때를 회상하는 듯한 태도로 보였다.
[네가 뭘 안다고 그러는 건데!]
생각을 마쳤다는 듯, 눈 앞의 소녀는 눈을 감고 한숨을 내쉬더니, 고개를 내가 있는 방향으로 돌린다.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다 안다는 듯 지껄이지 말라고!]
소녀가 살짝 미소를 짓는다. 거절에 대한 미안함, 자신을 알아준 것에 대한 감사가 섞인, 어쩌면, 너무나 익숙한 표정.
[미안, 너무 말이 심했 어. 그냥.. 그냥 가 줘.]
“미안, 역시.. 안될 것 같아.”
“어째서?”
어째서? 네 표정은 본 적이 있어. 원하는 게 아니야? 기회가 왔는데, 어째서 잡지 않는 거냐고! 그렇게 시궁창에 떨어져 한탄만 하면, 뭐가 바뀌는데!
방금보다 상당히 낮고 진지해진 목소리와 분위기에, 그녀가 살짝 당황한다.
[잘못 본거야. 그런 게, 내게 가능할 리 없잖아?]
“내게는 무리니까.”
고개를 살짝 숙이고, 조금 우울하게 그녀가 대답한다. 분위기에 약간 겁먹은 건가? 아니, 그게 아니다. 이건 그저, 기대하기도 지쳐버린 듯한, 무엇도 더 이상 믿고 싶지 않다는 실망감.
[이 이상 내게 다가오지 마.]
“지금, 난 완전 뭐랄까.. 여러모로 최저, 최악이거든.”
“…”
[미안, 약속은, 못 지킬 것 같다.]
그녀가 등을 돌린다. 그러고는 인사 대신이라는 듯 살짝 고개를 돌리고, 초연한 미소를 지어 보인다.
“미안, 다른 사람 알아봐 줘.”
그 말을 끝으로, 방금 봤을 때 보다 조금 더 빠른 걸음으로 그녀가 멀어져 간다.
알 것 같다. 조금이라도 상처 받을 것 같은 헛된 희망에서 도망치고 싶은 기분. 이미 추락을 경험한 사람은,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 할 수 밖에 없다. 땅에서 넘어지면 약간 다치는 것으로 끝날지 모르지만, 희망을 붙잡고 위로 올라간다면 이야기가 다르다.
“빌어먹을.”
결국 할 말은 욕 밖에 없나. 발을 때지 못한 채, 그녀가 사라질 때까지 난 그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 볼 수 밖에 없었다. 뒤도 돌아보지 않는 다는 건, 그만큼 겁을 먹었다는 것이겠지.
그런 그녀를 잡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책임질 수 없는 행동을 책임 질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은 오만에 불과하다. 실수는 한번으로 족하니까, 누구에게도 상처가 되지 않도록, 없던 일로 생각하고 기억 속에 묻어야 한다.
“빌어먹을, 이름 정도는 물어볼 것을 그랬나.”
그럼에도, 쓸데 없는 미련은 남는다.
거의 몇달만에 담배를 입에 문다.
------------------------------------------------------------------------------------------------------------------------------------------
카렌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근데 안즈 때문에가 아니라 카렌 때문에 폐암 걸려 죽을 플래그.
원래 카에데씨랑 대화하는 후반부가 있었는데, 다쟈레 때문에 그건 다음화로 미뤘습니다(..)
총 4,601건의 게시물이 등록 됨.
2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쟈레 때문에
주인공 벌써부터 이러면 카렌 들어올때쯤엔 속에서 석탄 나오겠네요 하하 하하하
그놈의 다쟈레 때문에 카에데씨 등장이 막혀서..
그리고 석탄은.. 그걸 막기 위한 미호입니다!(무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