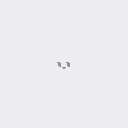 작성자:
미키를전력으로프로듀스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8.230.*.*)
작성자:
미키를전력으로프로듀스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8.230.*.*)
일반 프로듀서
글
댓글: 2 / 조회: 915 / 추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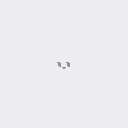 작성자:
미키를전력으로프로듀스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8.230.*.*)
작성자:
미키를전력으로프로듀스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8.230.*.*)
일반 프로듀서
관련 링크가 없습니다.
* 직접 글을 써보는 것은 처음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후…춥다, 추워.”
오늘은 1월 1일.
연휴랍시고 사람들은 해돋이도 보러 가고, 연인을 만나기도 하고 멀리 해외여행을 가기도 하는 시기이지만 나에게 그런 건 없다. 아이돌의 프로듀서란 직업은 연휴일 때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평생을 연휴로 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주변의 친구 놈들은 죄다 여행가고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얼마 전 집 근처에 생긴 작은 신사였다. 1년쯤 전인가 갑자기 생긴 신사에는 이상하리만큼 주민들의 발길이 적었다. 나도 처음에는 갈 생각이 없었지만 언젠가 중요한 라이브 공연을 앞두고 긴장되어 발걸음을 옮긴 적이 있었다.
담당 아이돌의 앞날을 좌우하는 라이브였기 때문에 더욱 그랬던 것 같았다. 제발 성공하게 해달라고, 관객들로 붐비게 해달라고 빌었다. 무슨 기분에서인지 세전함에도 1만 엔이나 넣었는데 거짓말처럼 다음날 엄청난 관객들이 몰려왔고 대성공이었다.
뒤풀이를 하다가 문득 그 신사가 생각나 다시 가보았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신사는 그 자리에 계속 있었다. 나는 감사한 마음을 담아 다시 한 번 1만 엔을 넣고 기분 좋게 참배를 드리고 집으로 왔다.
그 이후로 출근길, 퇴근길에 그 신사는 소소한 즐거움이 되었다. 그 소소한 즐거움은 곧 일상적인 습관으로 자리 잡았고 그 후 매일을 출근하는 길에 신사에 들러 세전함에 돈을 넣고, 참배하는 일은 내 일과의 하나가 되었다.
오늘도 막 출근길에 세전함에 들러 돈을 넣고 가려던 참이었다.
“응?”
뒤돌아서는 내 발걸음 소리 외에도 하나가 더 들렸다. 분명히 찾는 사람도 없고, 같이 올라온 사람도 없는데 이상하게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수상했지만 나는 어제 과음한 탓에 잘못 들었겠지 싶어 뒤돌아 가려고 했다.
바스락-.
“역시, 뭔가가!”
크게 소리치며 뒤돌았을 때 본 풍경은 참으로 가관이었다. 내가 소리를 지른 탓에 깜짝 놀랐는지 세전함 근처에 있던 누군가가 도망치려고 했지만 급하게 움직이는 탓에 그 사이에 손이 껴서 낑낑대고 있었다.
“요즘 시대에 세전함을 털어가는 녀석도 있다니….”
나는 한숨을 내쉬며 낑낑대는 사람 곁으로 가보았다. 굉장히 날렵한 체격을 가진 도둑이라고 예상했는데, 막상 보이는 것은 굉장히 낡은 옷을 몇 겹이나 기워 입은 여자아이였다. 내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는 울음부터 터뜨렸다.
장가도 안 간 남자한테 대뜸 여자아이의 울음이라니, 새해부터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냥 내버려두고 갈까 싶었지만 안쓰러워서 그럴 수도 없었다. 손 하나를 세전함에 집어넣은 채 울고 있는 여자아이라니…새해부터 이게 무슨 일이람.
빠직-!
나는 속으로 신에게 용서를 빌며 세전함을 부수었다. 때마침 옆에 적당한 크기의 돌이 있어서 다행이었다. 손을 빼낸 여자아이는 연신 코를 훌쩍였지만 울음은 조금 잦아든 것처럼 보였다. 한숨을 쉬며 신사의 마루에 주저앉은 나는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다.
“아악-!”
요 1년 동안 내가 세전함에 넣어두었던 돈이 한 푼도 없었다. 무녀도 없는데 누가 훔쳐갈 사람이 있을 리가….
“혹시!”
내가 눈을 부릅뜨며 추궁하자 아이는 언제 울었냐는 듯 새침한 표정으로 내게서 멀어졌다. 어이가 없다 못해 안드로메다로 날아갈 지경이었다. 힘이 쭉 빠져서 화조차도 나지 않았다.
“하…네가 다 가져갔구나.”
“…덕분에 생활비로 잘 쓴 거야.”
“거야?”
굉장히 특이한 말투를 가진 아이였다. 나는 그녀의 차림새 하나하나를 꼼꼼히 훑어보았다. 어깨 부분이 찢어져 추위로 살갗이 붉게 달아오른 모습이나, 끈마저 떨어진 여름 신발로 볼 때 생활비로 잘 썼다고는 보기 힘들었다.
측은한 마음이 먼저 들었다.
“…생활비로 쓰긴 썼냐?”
“미, 미키는 제대로 쓴 거야!”
이름이 미키였나, 억양이 굉장히 부드럽고 예쁜 이름이었다.
“하…그래서, 오늘은 어쩌다가 걸리게 됐냐.”
“…당신, 오늘 여기에 3일 만에 온다는 건 알고 있는 거야? 미키, 배고파서 죽을 뻔했다구.”
“그랬나?”
그러고 보니 연말 라이브 준비한다고 다른 지방에 내려가 있었던 게 생각났다. 아마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모양이었다. 미키는 그러고도 몇 분을 툴툴거리더니 고맙다는 인사도 남기지 않고 눈길을 저벅저벅 걸어갔다.
나는 동시에 시계를 보았다. 이미 지금 출발해봤자 회사에 제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 리가 없었다. 하늘을 향해 한숨을 쉬자 찬 공기가 얼굴을 덮치며 머리카락을 어지럽혔다. 눈길을 따라 신발조차 신지 않고 걸어가는 미키의 모습이 눈에 밟혔다.
“괜히 쓸데없는 일에 휘말려서는….”
저걸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갈 수는 없었다. 추워서 죽기라도 하면 내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가 될 것 같은 느낌에서였다. 하는 수 없이 일어선 나는 눈길 위에 미키가 남긴 발자국을 그대로 밟으며 뛰었다.
총 2,740건의 게시물이 등록 됨.
2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