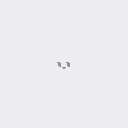 작성자:
APpastel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9.165.*.*)
작성자:
APpastel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9.165.*.*)
일반 프로듀서
글
댓글: 6 / 조회: 496 / 추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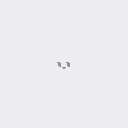 작성자:
APpastel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9.165.*.*)
작성자:
APpastel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9.165.*.*)
일반 프로듀서
관련 링크가 없습니다.
마음이 너무 잘 드러나는 두 사람에 이어, 너무 안 드러나는 두 사람의 얘기입니다.
---
취미도 안 맞고, 관심사도 안 맞고, 서로 대화도 많지 않은데 사이가 좋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친구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만 그런 걸지도 모릅니다. 그런 친구들을 사귀면서도 어떻게, 왜 사이가 좋은 건지 저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친합니다. 만나면 잘 놀고 웃고 떠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서로 안 맞을 것 같은 사람들끼리도 묘하게 잘 맞는다는 게,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
“그럴 수 있지.”
“뭔 소리야?!”
멀쩡한 사람이 아침부터 소리를 지르게 만드는 저 한 마디. 린이 아무 말도 없이 내 무릎에 앉아 “소파가 더러워서.”라는 심플한 대꾸에 덧붙인 말이다. 심지어 등 쪽을 향하게 앉은 것도 아니고, 자기 배를 내 쪽으로 향하게 앉아서 아무렇지 않게 “그럴 수 있지.”라고, 국어책 읽듯 담담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 없잖아?”
“없기는 내 어이가 없지....”
항상 쿨한 척, 쌀쌀맞은 척만 하던 린이 평소와 다르게, 오늘은 아침부터 체온의 따스함을 나한테 가르치려 들고 있다.
겨울철이기도 하고, 배를 맞대고 앉은 것도 있어서 일단 따뜻한 느낌은 든다. 하지만 까놓고 말해서 정말 곤란하다. 여러가지로.
“오늘부터 전략을 바꾸기로 했어?”
“자세만 좀 바꾼 거야.”
“자세만 바꾼 게 아닌 것 같은데.”
“흐~응. 글쎄.”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아직도 부끄러워하는 기색을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
평소에 린이 하는 짓을 생각해보면 이제 와서 부끄러워하는 것도 어떨까 싶지만, 문제는 내가 매번 부끄럽다. 부끄러워서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계속 이렇게 있기도 힘들 테니까 내버려둬야지. ...솔직히 좋긴 좋으니까.
*
지난번에 후미카를 보고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다. 저 정도로 마음이 잘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구나, 하고. 질투라고 할 건 없지만, 꽤 부러웠던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해본 게 지금 이거다. 자세 만으로도 충분히 부끄러운데 프로듀서가 반응이 없는 게 더 부끄럽다. 늘 처음엔 당황하는 척 하면서, 얼마 안 가서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긴 했지만 이것 마저 반응이 없을 줄은 몰랐다.
간단하게 말해서, 지금 충분히 부끄럽다는 얘기다.
“아무렇지 않아?”
“아무렇지 않겠냐.”
프로듀서는 아까부터 내가 하는 말에 꼬박꼬박 대답해주고 있지만, 일어나라는 말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무심하게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고, 나는 그냥 무릎 위에 앉은 어린애 취급....
아무렇지 않은 듯, 아니, 정말 아무렇지 않아 보인다.
이제 슬슬 일어나라고 할 때도 됐는데.
“앗.”
“어?”
방금 잠깐이지만 볼이 닿았다.
“아니, 지금은 일부러 그런게....”
“목도리라도 하고 다녀. 많이 차갑네.”
“...아, 응.”
아주 잠깐이었지만, 꽤 따뜻했다. 아, 아니, 그거 말고. 그래도 이번엔 조금 당황했는데, 정말 조금도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구나. 설레기는커녕 저렇게 걱정만 하고 있고.
바꾼 전략도 소용이 없는 건, 이제 어떻게 해야 좋은 걸까?
*
...말랑말랑했지. 역시 탑 아이돌 다운 피부... 아아아아니!
깜짝 놀랄 정도로 차가웠다. 방금 그건 신경 쓰지 못했을 정도로. 차갑지 않았더라면 아마 “부드럽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했을 수도 있었지만, 안 될 짓이다.
“그런데 오늘 오프 아니었어?”
“아, 그랬나?”
“그랬나? 는 무슨. 네가 일정을 착각할 리가 없잖아.”
“뭐, 착각할 수도 있는 거지.”
“글쎄....”
이럴 때 ‘흐~응’ 이라고 하면 되나?
린도 사람이니까 착각할 수도 있는 건 맞다. 다만 지금까지 착각한 적이 단 한번도 없었을 뿐. 오프인 날에 온 것도 처음은 아니지만, 보통 학교 끝나고 오는 거나 다른 아이들을 보러 오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게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짓을 보면, 절대 착각한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따뜻할 것 같아서 왔지.”
“사무소가 따뜻해봤자 집보다 더하겠어?”
“집보다 따뜻한... 데?”
“...어, 응. 그래.”
...웬만하면 아무렇지 않게 넘기려고 했는데, 방금 그 말을 하는 타이밍에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하는 건 반칙 아닌가?
그 자세 그 눈빛으로 지금 “집보다 따뜻하다”라는 건 좀....
*
사무소에 온 이후로 처음으로 일정을 착각해서, 솔직히 말해도 안 믿을 것 같으니까 핑계를 좀 댔는데 말이다. 그냥 대지 말 걸 그랬다.
“....”
“....”
지금까지 안 마주치고 있었는데, 괜히 변명하려다 이상한 타이밍에 눈이 맞아버려서....
“프, 프로듀서?”
“...어. 왜?”
“그... 일 하는데 방해되지 않아?”
“드디어 물어보는구나.”
말은 안 하고 있어도 슬슬 일어나야겠지. 나는 일이 없지만 프로듀서는 일하는 중이니까. 게다가 이렇게 눈앞에 대놓고 앉아서는 방해가 안 될 리가 없다.
...무엇보다도 이 자세는 내가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
“옆으로 조금만 나와봐.”
“어? 그 쪽이야?”
“왜?”
완전히 비키거나 일어나라고 얘기하는 게 보통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이다. 어째서 끝까지 일어나라고 얘기하지 않는 걸까? 차라리 일어나라고 얘기해주는 쪽이 마음이 편한데, 저러면 오히려 프로듀서가 내 쪽을 배려해주는 것 같고....
잠깐. 프로듀서가 지금 나를 배려한다는 건, 내가 계속 이런 자세로 있길 원한다고 생각한다는 건데. 아무리 그래도 그건...!
“그럼... 이 정도면 돼?”
“...그걸로 괜찮으면 됐고.”
“응.”
그건... 맞다.
차마 아니라고는 말 못하겠다.
*
그건 아니지....
그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다.
옆으로 나오라고 얘기했으면 좀 눈치를 봐서 나올 줄 알아야지. 정말 옆으로 조금만 돌아서 이런 식으로 끝까지 붙어있겠다는 속셈인가.
게다가 그 바꾼 자세라는 게, 그냥 왼쪽으로 90도 회전해서 나한테 옆으로 기댄 자세다. 말 그대로 품 안에서 기대서 잠드는 모양. 자세를 바꾸기 전이나 후나 일하는데 크게 방해는 안 되지만, 슬슬 심장에 부담이 온다.
“...이대로 잠이나 잘까.”
“좋냐? 좋아?”
“...솔직히 좋아.”
“너무 솔직한 거 아니냐....”
이 정도로 눈치가 없기도 힘들 것 같다.
어느 부서의 누구는 말을 안 해도 척척 맞던데, 여기 이 분은 말을 해도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딱히 어떻게 할 마음도 들지 않는다.
그래요, 내가 어쩌겠습니까. 탑 아이돌 분께서 이 자리가 좋다고 하시는데.
기꺼이 내드려야지요.
**
아무도 없는 사무실, 아무 말도 없는 조용한 곳에서 계속 그러고 있으려니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정말로 잘 생각은 없었는데.
내가 잠이 든 사이, 언제부터인가 아무 말 없이 프로듀서가 내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다.
쓰다듬어 달라고 부탁했을 때는 무시했으면서, 정말 이제 와서다.
“흐음....”
“일어났어?”
무릎 위에 앉아있는 자세 그대로 기지개를 켠다. 그렇게 편해 보이는 자세는 아닌데 엄청 편하게 잔 것 같네. 하품까지 하고 있고.
속 편해서 좋겠다. 나는 겉으로도 속으로도 불편한데 말이지.
“나 얼마나 잔 거야?”
“글쎄다... 일하느라 신경을 못 썼네.”
시계를 보니 30분 정도 지난 것 같다.
컴퓨터도 꺼져있고, 책상도 깔끔한 걸 보니 프로듀서도 일을 끝낸 것 같다. 아까보다도 훨씬 조용하다고 느꼈던 건 이것 때문이었나.
이 자세 그대로 책상을 치우는 건 꽤 불편했을 것 같은데... 민폐였을까?
“불편하지 않았어?”
“그러게, 좀 불편했네.”
“미안. 프로듀서.”
솔직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긴 하지만, 린이 사과를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럼, 이걸 구실로 뭔가 시켜볼까?
“아까 소파 더럽다고 했지? 나중에 청소해.”
아, 생각해보니까 처음에 그런 말을 했었다. 그냥 변명이었으니까 솔직하게 말할까.
“아니, 그거 그냥 거짓말....”
“그럼 거짓말한 벌로 사무실도 청소해.”
“...응.”
오늘은 어째 변명이 잘 안 되는구나....
좋아. 이 정도면 깔끔한 마무리였다.
“밥이나 먹으러 가자. 벌써 점심이다.”
“둘이서?”
“둘이서.”
---
본격 푸드엔딩.
이번엔 린과 린P의 짧은 이야기였습니다.
후미카랑 후미카P에 비해 대화가 좀 많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두 사람과 달리 똑바로 말을 해도 자꾸 어긋나는 두 사람이라는 느낌으로 써봤네요.
일단 쓰고 보니 제가 린을 잘 몰라서 캐릭터 붕괴가 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아무튼 그랬습니다.

저도 이거 써보고 싶었어요!
총 4,602건의 게시물이 등록 됨.
6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신기하네요? 저렇게 안 맞을 수도 있구나;;;;
서로 좋아하는 느낌의 사이인데도...
실제로 말 하나하나가 다 엇박자인데 저렇게 넘어간다면 평생 싸울 일은 없을 거예요